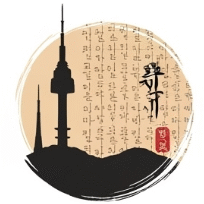한국어 교육자를 위한 용어 해설집
통시적 연구 / 공시적 연구
통시적이라는 말은 시간을 따라 흐른다는 뜻으로 통시적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살펴보는 연구 방법이다. 예전에 쓰던 말이 지금은 다르게 바뀌거나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한다. 이렇게 언어의 변화 과정과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통시적 연구이다. 예를 들어,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국어 문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통시적 연구에 해당된다. 반면, 공시적 연구는 어특정한 시기의 언어 상태를 연구하는 방식이다. 즉, 시간의 흐름은 고려하지 않고, 현대 한국어, 중세 한국어와 같이 일정한 시기에 나타난 언어 구조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분석하는 것이다.
방언
방언은 같은 언어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쓰이는 말이다. 즉, 지역마다 사람들이 말하는 발음, 단어, 문법, 억양 등이 조금씩 다른 언어 체계를 말한다. 방언은 지리적 요인에 따른 언어 변이의 결과인 지역 방언과 계층, 연령, 성별 등과 같은 사회적인 요인에 따른 언어 변이인 사회 방언으로 나뉜다. 지역은 산과 강, 바다와 같은 지리적 경계를 중심으로 언어 사용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다. 계층은 사회 내에서의 일정한 지위를 말하며, 연령은 특정한 연령의 화자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다른 연령대의 화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구분한다. 성별은 사회적으로 규정된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따라 달라지는 언어 사용 체계이다.
고대 국어
고대 국어는 역사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랜 시기의 한국어인 삼국 시대부터 통일 신라 시대까지의 한국어를 가리킨다. 고대 한국어 시기에는 말로는 한국어를 사용하면서도 이것을 쓸 수 있는 문자가 없어서 글을 적을 때는 한자와 한문을 이용하였다. 그 후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한국어 문장을 적던 이두, 향상, 구결 등의 차자 표기법을 마련해서 사용하였다. 그러나 차자 표기 방법으로는 한국어를 완전하게 쓸 수 없었다.
한자 차용
한자 차용이란 한글이 만들어지기 이전 시대에 한국어를 글로 쓰기 위해 중국의 한자(漢字)를 빌려서 사용한 것을 말한다. 고대 한국어 시기는 한글이 없었기 때문에 글을 쓸 때 한자가 필요했다. 이 과정에서 한자를 한국어의 어휘나 문법 구조에 맞게 변형하거나 조합하여 사용하는 독특한 표기 방식이 나타났다. 한자 차용의 대표적인 방식에는 음차(소리만 빌림), 훈차(뜻만 빌림), 혼용(소리와 뜻을 함께 빌림)이 있었으며 이를 활용한 표기법에는 이두(吏讀), 향찰(鄕札), 구결(口訣) 등이 있다.
이두
이두는 한자의 음(소리)와 훈(뜻)을 빌려 한국어의 문장을 표기하던 방식 중 하나다. 예를 들어 조사나 어미처럼 문법적인 요소를 한자의 음을 빌려 표현했다. 이두는 한국어 문장의 순서에 맞춰 단어를 배열하고 문법 형태까지 나타낼 수 있어서 단순한 한자 표기보다 훨씬 더 한국어 문장에 가깝게 표현할 수 있었다. 이두 표기법은 삼국 시대에 처음 나타나 조선 시대 말기까지 주로 공문서에 사용되었다. 하지만 한자를 많이 알아야 쓸 수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았고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향찰
향찰은 한자의 음(소리)와 훈(뜻)을 빌려 한국어의 문장을 표기하는 방식 중 하나다. 향찰은 향가라는 옛날 노래를 글로 적을 때 사용한 표기법으로, 향찰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유래했다. 향찰은 기본적으로 한국어의 어순을 따르면서 한 문장 안에서 한자를 어떤 것은 소리로 읽고, 어떤 것은 뜻으로 읽는 방식을 사용한다. 향찰은 문법적인 요소도 함께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국어 문장을 직접 표기하는 데 적합한 방법이었다. 향찰은 고대 한국어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훈민정음 창제 원리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하고 1446년에 반포한 한국의 고유한 문자다. 훈민정음은 어려운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이 쉽게 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었다. 훈민정음은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을 담고 있다. 훈민정음은 소리 나는 원리를 바탕으로 자음과 모음을 과학적으로 만들었다. 지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이라는 천지인 삼재 사상을 바탕으로 만들었다. 예를 들어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ㅁ은 입 모양, ㅅ은 이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중세 국어
중세 국어는 고려 시대(10세기)부터 16세기 말까지 사용된 한국어를 말한다. 이 시기는 훈민정음이 만들어져 실제로 한글로 쓴 문헌들이 간행되면서 한국어의 모습을 문자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중세 국어는 오늘날의 한국어와는 다른 소리와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쓰이지 않는 ㆍ(아래아), ㅸ(순경음 비읍), ㅿ(반치음) 같은 자음과 모음이 있었고, 말의 높낮이를 구분하는 성조도 있었다. 또한 단어의 첫 부분에 자음을 겹쳐서 쓰는 어두자음군도 사용되었다. 이처럼 중세 국어는 현대 국어와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현대 한국어의 소리, 문법, 어휘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는 언어 자료다.
어두자음군
어두자음군이란 단어의 첫머리에 자음 두 개가 겹쳐서 나오는 소리 구조를 말한다. 현대 한국어에는 이러한 구조가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실제로 어두자음군을 가진 단어들이 존재했다. 예를 들어, 쌀이라는 말은 본래 ㅂ쌀처럼 단어 앞에 자음이 하나 더 붙어서 발음되었고, 발음의 흔적은 찹쌀, 좁쌀, 햅쌀 과 같은 단어 속에 남아 있다.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어두자음군은 발음하기가 어렵고 자연스러운 소리 흐름에 맞지 않아 대부분 사라지거나 된소리(쌍자음)으로 바뀌거나 단순한 형태로 변화했다. 어두자음군은 한국어의 음운이 어떻게 변화하고 단순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성조
성조는 말소리의 높낮이에 따라 단어의 뜻을 구별하는 음운상의 특징이다. 중세 국어에는 네 가지 성조 체계가 있었는데 낮은 소리(평성), 높은 소리(거성), 처음이 낮고 나중이 높은 소리(상성), 짧고 급하게 끝나는 소리(입성)으로 나뉘었다. 이러한 성조는 글자 위에 점을 찍어 구분했다. 예를 들어 점 하나는 거성, 점 두 개는 상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표기법은 훈민정음 해례본 등 중세 시대 문헌에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다. 현대 국어에서는 이러한 성조 체계가 사라졌지만 말의 길이(장단)나 억양, 강세 등으로 그 흔적이 일부 남아 있다. 예를 들어 눈이 온다(하늘에서)와 눈이 아프다(신체)이라는 문장을 말할 때 첫 번째 문장은 길게 말하고, 두 번째 문장을 말할 때는 짧게 발음하여 의미를 구별할 수 있다.
문법화
문법화는 원래는 단어나 구와 같은 어휘 요소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사나 어미 처럼 문법적인 기능을 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같이는 원래 부사인 함께라는 의미로 쓰였지만 지금은 친구같이, 선생님같이등으로 체언(명사) 뒤에 붙어서 조사처럼 사용한다. 또한 할게요는 하겠다 + -예요가 결합한 표현이지만 현재는 하나의 어미처럼 굳어져 의지나 약속의 의미를 나타내는 문법 표현으로 사용된다. 이런 문법화는 언어 사용에서 자주 반복되는 표현이 점점 문법적 기능을 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어휘화
어휘화는 두 개 이상의 말이나 문법 요소가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처럼 굳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원래는 따로 쓰이던 말들이 오랜 시간 자주 함께 쓰이면서 점차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고 굳어지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눈뜨다, 귀먹다와 같은 말은 각각 두 단어가 합쳐졌지만, 지금은 하나의 단어처럼 사용된다. 또 쓸데없이, 한잔과 같은 단어들도 처음에는 쓸 데가 없이, 한 잔처럼 띄어서 썼지만, 이제는 한 단어처럼 굳어져서 하나의 어휘로 사용되고 있다. 어휘화는 언어가 자주 사용되면서 점점 간결해지고 단순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단어가 생기기도 하며 한국어사적으로 중요한 변화 양상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어원
어원(語源)은 한 단어의 근본적인 형태나 의미, 그리고 그 단어가 생겨난 근원을 말한다. 즉, 말의 뿌리로, 어떤 단어나 표현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시간이 지나며 어떤 변화 과정을 거쳐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바로 어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