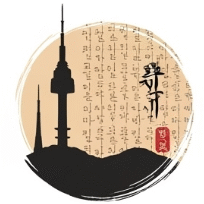한국어 교육자를 위한 용어 해설집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은 한국어를 한글로 표기할 때 따라야 하는 전체적인 규칙을 말한다. 예를 들어 ‘밥을 먹다’라는 문장은 [바블 먹따]로 발음되지만 ‘바블 먹따’라고 쓰는 것은 올바른 표기가 아니다. 실제로 글로 쓸 때는‘밥을 먹다’처럼 단어의 원래 형태를 유지하여 적는다. 이처럼 소리나는 대로만 쓰지 않고 어법에 맞게 쓰는 것이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칙이다. 실제로 한글 맞춤법 총칙에는‘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한글 맞춤법에서는 소리 나는 대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단어의 원래 모양(형태)과 문법에 맞게 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꽃이 피다’에서 ‘꽃이’는 [꼬치]라고 발음되지만 ‘꽃이’라고 써야 한다. 왜냐하면 ‘꽃’이라는 단어의 본래 모습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글 맞춤법은 모든 사람이 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기준이 된다. 한국어는 지역마다 말투나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표준어와 맞춤법이라는 공통된 규칙을 정해 두면 서로 다른 지역 사람들도 같은 글을 보고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한글 맞춤법에는 띄어쓰기 규칙도 포함되어 있으며 문장 부호 사용법도 부록에서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표준어
표준어란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규범적인 말을 의미한다. 한국어는 지역마다 말하는 방식이나 단어가 조금씩 다른데 모든 사람이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공통으로 쓰는 언어 형태가 바로 표준어이다. 표준어는 단순히 서울 사람들이 쓰는 말이라는 뜻이 아니라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바탕으로 정한 언어 규범이다. 198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표준어 규정에 따라 정리되어 있으며 모든 공공 문서, 방송, 교육 등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표준어 규정은 표준어 사정의 원칙과 표준 발음법을 체계화한 규정이다.
외래어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은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방법을 말한다. 한국어는 다른 나라의 문화, 물건 등을 가리키기 위해 외국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외래어를 한국어로 바르게 적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리 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쓰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통일된 기준에 따라 한글로 표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영어 단어 ‘computer’는 소리만 듣고 적으면 ‘컴퓨타’나 ‘콤퓨터’처럼 다양하게 쓸 수 있다. 하지만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정해진 방식으로 ‘컴퓨터’라고 써야 한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외래어 표기법이다. 외래어 표기법은 발음을 가능한 한 반영하되 한국어의 음운 체계에 맞게 조정하여 표기하는 원칙을 따른다.
표음 문자
표음 문자란 말소리(음)를 그대로 적기 위해 만든 문자를 말한다. 즉 소리를 그대로 기록할 수 있도록 만든 글자 체계이다. 사람의 말은 기본적으로 소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소리를 글로 표현하려면 소리 하나하나에 맞는 기호가 필요하다. 이처럼 소리와 글자가 일대일로 대응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문자가 바로 표음 문자이다. 한글은 대표적인 표음 문자이다. 반면표의 문자는 뜻을 나타내는 문자로 한자(漢字)와 같은 문자가 이에 해당한다. 표의 문자는 한 글자가 곧 하나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한글 자모
한글 자모는 자음과 모음 하나하나의 글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나라는 글자는 자음 ㄴ과 모음ㅏ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처럼 ㄴ과 ㅏ는 각각 하나의 자모이고 두 자모가 만나서 나라는 글자가 되는 것이다. 한글 자모 수는 자음 14개, 모음 10개로 총 24개(스물넉 자)의 기본 자모가 있다. 이 자모들을 서로 조합하면 아주 많은 글자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자음 두 개를 합친 겹자음이나 모음 두 개가 합쳐진 이중모음도 있어 더 다양한 소리와 표현을 가능하게 해 준다.
두음 법칙
두음 법칙은 어떤 소리가 단어의 첫머리(두음)에 올 때 특정한 자음이 다른 자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녀자(女子)라는 단어는 한자음으로는 녀자라고 읽지만 실제로는 여자라고 쓴다. 이처럼 단어의 첫소리에 ㄴ이나 ㄹ이 오는 것을 피하고 ㅇ이나 다른 자음으로 바꿔서 표기하는 규칙이 바로 두음 법칙이다. 두음 법칙은 원칙적으로 한자어에만 적용되며 고유어나 외래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어의 음운 체계가 단어 첫머리에 ㄹ이나 ㄴ 소리가 오는 걸 부자연스럽게 여기기 때문이다.
접두사
접두사는 단어 앞에 붙어서 새로운 뜻을 더하거나 기능을 더해준다. 즉, 어근에 겹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며, 단어의 맨 앞에만 붙는다. 또한 접두사는 혼자서 쓰이지 않고 반드시 다른 말과 겹합해서만 사용된다. 예를 들어 헛이라는 접두사는 소리라는 단어 앞에 붙어 헛소리가 되는데 쓸모없거나 의미 없는 소리라는 뜻을 만들어 낸다. 큰아버지에서의 큰, 맨손에서의 맨모두 접두사에 해당한다. 이처럼 접두사는 단어에 의미를 더하고 확장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는 중요한 언어 요소이다.
합성어
합성어는 둘 이상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예를 들어 손과 목이라는 단어가 결합해 손목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만들지고, 눈과 물이 합쳐져 눈물이라는 단어가 된다. 합성어는 구성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어진다. 명사끼리 결합한 물고기, 꽃길, 동사와 명사가 결합한 먹거리, 형용사와 명사가 결합한 큰소리, 또는 부사와 동사가 결합한 잘나다, 못나다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어근들이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 합성어는 토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뉜다. 비통사적 합성어는 한국어의 정상적인 단어 배열법을 보이는 합성어로 논밭, 작은집등이 있다. 비통사적 합성어는 한국어의 정상적인 단어 배열법에 어긋나는 합성어로 늦잠 이나 검붉다등이 있다.
의존 명사
의존 명사는 관형어의 수식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명사의 하위 분류이다. 즉, 혼자서는 완전한 뜻을 가지지 못하고 앞에 오는 말에 기대어 쓰여야 의미가 드러나는 명사를 말한다. 일반 명사와 비슷하지만, 항상 다른 말의 도움을 받아야만 문장 안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의존명사라는 이름이 붙었다. 예를 들어 내가 읽은 것이라는 표현에서 것은 읽은이라는 앞말이 없으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다. 것이라는 말만 따로 놓고 보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으며 반드시 읽은이라는 관형어에 의존해야만 의미를 갖는다. 대표적인 의존 명사에는 것, 줄, 데, 수, 리, 적, 바 등이 있다. 그가 올 줄 몰랐다., 이기는 수밖에 없다., 오랜만에 찾은 곳은 그대로였다.와 같은 표현에서 모두 앞에 수식어(관형어)가 반드시 있어야 의미가 완성된다.
사이시옷
사이시옷은 두 개의 명사가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가 될 때 그 사이에 들어가는 ㅅ 받침을 말한다. 이 ㅅ은 원래 단어에 없던 글자지만 단어 사이의 소리를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이어 주기 위해 들어간다. 예를 들어 나무와 잎이 결합하면 나뭇잎, 고기와 국이 만나면 고깃국이 된다. 이처럼 두 명사가 결합하면서 그 사이에 들어간 ㅅ이 바로 대표적인 예이다. 사이시옷은 주로 앞말과 뒷말이 모두 명사일 때 나타나며, 앞말이 고유어이거나 뒷말이 된소리(예: ㄲ, ㄸ, ㅃ 등)로 시작할 때 자주 나타난다. 나뭇잎은 [나문닢], 고깃국은 [고기꾹]처럼 발음되며 된소리 발음을 유도하거나 소리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기능을 한다.
어간과 어미
어간은 활용어의 중심이 되는 줄기 부분으로 활용할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을 말한다. 한국어의 동사나 형용사와 같은 용언은 문장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먹다라는 동사는 먹고, 먹자, 먹었다, 먹는다처럼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바뀐다. 이처럼 용언이 문법적인 기능에 따라 형태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을 활용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활용되는 말을 구성하는 두 부분이 바로 어간과 어미이다. 어간은 말의 중심 의미를 지닌 부분으로,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이다. 반면 어미는 어간 뒤에 붙어서 활용어의 주변부를 형성하는 형태소이다. 시제, 높임, 연결, 명령, 청유, 종결 등의 문법적 의미를 더해 준다. 예를 들어서 공부하다, 공부하고, 공부하니, 공부하면등에서 공부하-가 어간이고 -다, -고, -니, -면등이 어미에 해당한다. 어미는 문장에 따라 자유롭게 변하며, 문법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서수사
서수사는 사물의 차례나 등급, 일의 순서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수사의 한 종류이다. 즉, 몇 번째인가를 나타내는 말로 사람이나 사물의 순서, 사건의 순서 등 차례를 말할 때 쓰인다. 일반적으로 고유어 서수사는첫째, 둘째, 셋째…와 같이 고유어 양수사인 둘, 셋, 넷…등에 -째를 붙여서 만든다. 한자어 서수사는 제일, 제이, 제삼…과 같이 한자어 양수사인 일, 이, 삼… 처럼 등의 앞에 제-를 붙여서 만든다.
접사
접사는 단어를 만들 때 어근이나 어간에 붙어 의미나 기능을 더해주는 형태소이다. 접사는 혼자서는 쓰이지 않으며 반드시 다른 말에 붙어서만 의미를 가지는 특징이 있다. 접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접두사는 단어의 앞에 붙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풋잠, 풋사과와 같은 단어에서 풋은 아직 덜 읽은, 미성숙한, 제대로 되지 않은의 뜻을 가진다. 접두사는 단어의 품사를 바꾸지는 않고 기존 어근의 의미에 변화를 준다. 반면 접미사는 단어의 뒤에 붙어서 의미를 추가하거나 단어의 품사를 바꾸는 기능을 한다. 예를 들어가위질, 평화롭다등에서 -질, -롭-이 어근에 붙여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데 가위질에서처럼 어근의 품사를 유지하기도 하고 평화롭다처럼 어근의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거센소리
거센소리란 말소리 중에서 발음할 때 공기가 세게 터져 나오는 자음을 말한다. 한국어에서 ㅋ, ㅌ, ㅍ, ㅊ과 같은 자음이 거센소리에 해당한다. 이 소리들은 기본 자음인 평음(ㄱ, ㄷ, ㅂ, ㅈ)보다 강하게, 공기를 내쉬며 발음되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기와 키를 비교해 보면 기는 부드럽게 발음되는 평음이고 키는 ㅋ 소리에서 공기가 세게 나오는 거센소리이다. 한국어의 자음은 발음하는 방법과 세기에 따라 크게 평음(ㄱ, ㄷ, ㅂ, ㅈ), 된소리(ㄲ, ㄸ, ㅃ, ㅉ), 거센소리(ㅋ, ㅌ, ㅍ, ㅊ)로 나뉜다. 이 중 거센소리는 성대의 진동 없이 공기가 강하게 터지는 발음이 특징이다.
된소리
된소리는 발음할 때 힘을 주어 성대를 긴장시키고 공기를 강하게 터트리듯이 내는 자음을 말한다. 한국어의 자음 가운데 ㄲ, ㄸ, ㅃ, ㅉ, ㅆ이 된소리에 해당한다. 이러한 된소리는 같은 조음 위치에서 나는 평음 자음(ㄱ, ㄷ, ㅂ, ㅈ, ㅅ)보다 더 강하고 단단한 느낌으로 발음되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바다의 ㅂ은 부드럽게 발음되는 평음이지만 빵의 ㅃ은 입술에 힘을 주고 뱉듯이 내는 소리나는 된소리이다. 된소리는 보통 성대의 진동 없이 긴장된 상태에서 갑자기 막힌 공기를 터뜨리듯이 발음되며 다른 자음보다 더 분명하고 강한 소리로 들린다.
복수 표준어
복수 표준어란 하나의 뜻을 가진 말에 대해 둘 이상의 표현이 모두 표준어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원래 표준어는 하나의 형태로 통일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시대의 변화와 실제 언어 사용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여러 지역이나 계층에서 널리 쓰이는 표현이 있다면 이를 함께 인정하기도 한다. 이런 말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을 복수 표준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자장면과 짜장면, 소고기와 쇠고기는 서로 다른 형태지만 모두 표준어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으며 어느 표현을 써도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는다.
준말
준말이란 단어의 일부분이 줄어든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말을 좀 더 간편하게 하려고 긴 표현을 줄여 쓴 것이 바로 준말이다. 예를 들어 ‘사이’가 새로, 이야기는 얘기로 이야기하는 것이 해당된다.
무성 파열음
무성 파열음이란 소리를 낼 때 성대가 진동하지 않고 공기를 막았다가 한꺼번에 터뜨리면서 나는 소리를 말한다. 무성이란 말은 소리가 없음을 뜻하지만 여기서는 성대의 진동이 없는 상태에서 나는 소리를 의미한다. 파열은 공기를 일시적으로 막았다가 갑자기 터뜨리는 발음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ㅋ, ㅌ, ㅍ가 대표적인 무성 파열음이다. 카드의 ㅋ, 토마토의 ㅌ등이 모두 무성 파열음에 해당한다.
반모음
반모음이란 말 그대로 모음과 비슷하지만 모음처럼 완전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소리를 말한다. 즉 모음은 음절의 중심이 되는 소리지만 반모음은 그런 중심 역할을 하지 않고 모음 주변에서 덧붙는 보조적인 소리다. 한국어에는 두 가지 반모음이 있다.
▪ /j/: 혀를 앞쪽으로 당기며 나는 소리로 이에 가까운 느낌
→ (예) 야에서 ㅏ를 발음하기 전에 입을 적게 벌린 상태에서 발음하게
되는데 이때 ㅏ를 발음하기 전 단계에서ㅣ가 앞부분에서 짧고 약하게
들리는 소리가 반모음이다.
▪ /w/: 입술을 둥글게 모으며 나는 소리로, 우에 가까운 느낌
→ 예: 와에서 ㅏ를 발음하기 전 단계에서ㅜ가 앞부분에서 짧고 약
하게 들리는 소리가 반모음이다.
이처럼 반모음은 [j]와 [w]는 음절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나타나는 일이 없고 이들은 반드시 단모음과 함께 나타난다.
복합어
둘 이상의 형태소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를 복합어라 한다. 형태소란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로 단어의 뼈대를 이루는 어근 또는 접사와 같은 요소를 말한다. 즉, 복합어는 하나 이상의 뜻을 지닌 말이 합쳐져서 하나의 새로운 단어로 쓰이는 것이다. 복합어는 다시 어휘 의미를 가지는 형태소인 어근(단어 포함)끼리 결합한 합성어와 어근의 앞이나 뒤에 파생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로 나눈다. 복합어는 단순한 단어 하나가 아니라, 의미를 결합하거나 기능을 추가하면서 언어 표현의 폭을 넓혀주는 역할을 한다.
인명과 지명
인명이란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다.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역할을 하며 성과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지명은 지리적인 장소의 이름을 뜻한다. 도시, 나라, 강, 산, 마을 등 공간이나 장소를 특정해서 부를 때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