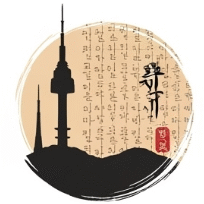한국어 교육자를 위한 용어 해설집
형태소(morphem)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고 할 수 있다. 단어를 더 이상 나눌 수 없으면서도 의미나 기능을 지닌 조각이다. ‘봄’, ‘하늘’처럼 하나의 형태소로 된 단어도 있지만, ‘첫사랑’은 ‘첫’과 ‘사랑’이라는 두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다. 이때 ‘의미’는 사전적인 뜻뿐 아니라 ‘-을’, ‘-자’, ‘-는’처럼 문법적인 기능도
포함한다. 형태소는 ‘어휘 형태소’와 ‘문법 형태소’로 나뉘며, 말의 구조를 분석할 때 기본이 되는 단위이다.
단어(word)
단어는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최소의 언어 단위로, 일반적으로 ‘최소의 자립 형식(minimal free form)’이라 정의된다. 그러나 이 정의만으로는 모든 언어 현상을 포괄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조사는 단독으로 쓰일 수 없고 반드시 체언에 붙어야 하므로 어떠한 관점에서는 자립 형식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눈꽃’, ‘첫사랑’처럼 두 개 이상의 자립 가능한 요소로 이루어진 합성어는 전체를 ‘최소’ 자립 형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단어를 정의할 때 ‘휴지 삽입 불가능성’(단어 내부에 일시적인 멈춤을 둘 수 없음)과 ‘분리 불가능성’(단어 내부에 다른 요소 삽입이 불가능함) 등의 형식적 기준도 제시된다. 하지만 ‘깨끗하다’처럼 ‘깨끗도 하다’에서 보이듯, 조사 ‘- 도’가 형용사 어간과 어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는 이 기준에도 예외를 드러낸다. 이는 ‘깨끗하다’가 하나의 단어이면서도 내부에 조사 삽입이 가능한 특수한 경우로, 문법 단위의 구분이 항상 명확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결국 학교 문법에서는 조사를 자립 형식이 아니더라도 하나의 단어로 간주하는 등 실질적 교육 목적에 따라 단어의 범위를 조정하고 있다.
교체
교체는 하나의 형태소가 문법 환경에 따라 다른 소리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웃다’의 어간은 상황에 따라 소리가 ‘웃으니[웃-]’, ‘웃고[욷-]’, ‘웃는다[운-]’처럼 달라진다. 이처럼 같은 뜻을 가진 형태소가 다르게 발음되는 것이 교체다.
이형태
이형태는 이렇게 교체되어 나타나는 각각의 다른 형태를 말한다. 즉, ‘웃-’, ‘욷-’, ‘운-’은 모두 ‘웃다’의
형태소‘웃-’이 가진 이형태이다.
단일어
단일어는 하나의 형태소로만 이루어진 단어를 말한다. 이런 단어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의미 단위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달’, ‘책’, ‘높-’, ‘가-’처럼 단순한 구조를 가진 말이 있다. ‘불’, ‘눈’, ‘뛰-’, ‘밝-’ 등도 모두 단일어에 해당한다. 복잡한 의미 변화 없이 하나의 뜻을 지닌 말이 단일어이다.
복합어
복합어는 둘 이상의 형태소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단어이다. 형태소가 결합되며 새로운 의미나 문법 기능을 갖게 된다. 복합어는 크게 파생어와 합성어로 나뉜다. 예를 들어 ‘풋과일’, ‘보름달’, ‘높푸르다’ 같은 단어들이 있다. 즉, 복합어는 단어 내부에 두 개 이상의 의미 단위를 포함하는 구조이다.
파생어
파생어는 어근에 접사가 붙어 만들어진 단어이다. 접사는 문법적 기능을 가지며, 뜻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풋과일(풋+과일)’, ‘맨발(맨+발)’, ‘선생님(선생+님)’ 등이 있다. ‘지우개(지우+개)’, ‘먹이(먹+ 이)’, ‘막말(막+말)’도 파생어에 해당한다. 접사는 어근 앞이나 뒤에 붙을 수 있으며,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낸다.
합성어
합성어는 두 개 이상의 어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다. 접사 없이 어휘적 의미를 가진 형태소들만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보름달(보름+달)’, ‘높푸르다(높-+푸르-)’처럼 어근끼리 결합한다. 또한 ‘책가방(책+가방)’, ‘돌다리(돌+다리)’, ‘손목(손+목)’도 합성어이다. 합성어는 뜻이 있는 단어끼리 만나 새로운 뜻을 만들어낸다는 점이 특징이다.
어근(root)
어근은 단어의 중심이 되는 부분으로, 어휘적인 의미를 지닌 실질 형태소이다. 단어에서 의미를 담당하는 핵심 요소이며, 혼자서 단어로 쓰이거나 다른 형태소와 결합해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 예를 들어 ‘달빛’에서는 ‘달’, ‘빛’이 각각 어근이고, ‘지우개’에서는 ‘지우-’가 어근이다. 어근은 명사, 동사, 형용사 등 다양한 품사로 나타나며, 파생어나 합성어의 중심을 이룬다. 즉, 어근은 단어가 전달하고자 하는 기본 뜻을 담당하는 중심 구조이다.
접사(Affix)
접사는 단어에 붙어 문법적 기능이나 의미 변화를 주는 형식 형태소이다. 자체적인 어휘 의미는 없으며, 단어를 꾸미거나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 접사는 어근 앞에 붙는 접두사(prefix)와 어근 뒤에 붙는 접미사(suffix)로 나뉜다. 예를 들어 ‘풋과일’의 ‘풋-’, ‘지우개’의 ‘-개’, ‘선생님’의 ‘-님’은 모두 접사이다. 접사는 품사를 바꾸거나 의미를 확장·제한하는 역할을 하며, 단어 형성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접사는 일반적으로 자립해서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어근과 결합하여만 사용된다.
어간(Stem)
어간은 동사나 형용사와 같은 용언이 활용할 때, 어미가 붙는 중심적인 실질 형태소이다. 즉, 의미를 담당하며 변하지 않는 기본 부분으로, 활용의 기초가 된다. 예를 들어 ‘먹는다’, ‘먹고’, ‘먹자’에서 ‘먹-’이 어간이다. ‘아름답다’, ‘아름다우니’, ‘아름다워서’의 경우 ‘아름답-’이 어간이다. 어간은 단독으로는 문장에서 사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어미와 결합해 쓰인다.
어미(Ending)
어미는 어간에 붙어 시제, 높임, 의도, 평서, 의문 등의 문법 정보를 나타내는 형식 형태소이다. 문장의 종결 방식이나 절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먹는다’의 ‘-는다’, ‘먹자’의 ‘-자’, ‘먹었으면’의 ‘-었으면’이 어미이다. 어미는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 뒤에 오며 매우 다양한 형태로 활용된다.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 등으로 나뉘며, 문장 내에서 문법적 기능을 수행한다.
활용(Conjugation)
활용이란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붙으면서 형태가 변하는 문법 현상을 말한다. 한국어는 교착어이므로 어간과 어미가 쉽게 분리되고 다양한 조합으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먹다’ → ‘먹는다’, ‘먹었다’, ‘먹자’, ‘먹고’, ‘먹으니’ 등은 모두 활용형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어미는 모음조화에 따라 ‘-아’, ‘-어’처럼 형태가 달라지기도 한다. 활용은 동사와 형용사가 문장에서 다양한 문법적 요구를 충족하게 해 주는 핵심적 기제이다.
품사
품사란 단어를 문법적인 성질에 따라 나눈 갈래를 말하며, 형태(변화 여부), 기능(문장에서의 역할), 의미(일반적 성격)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한국어 품사는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로 나눌 수 있다.형태를 중심으로 품사를 구분하면 동사, 형용사와 그 외로 구분할 수 있다.기능을 중심으로 품사를 구분하면 체언, 관계언, 용언, 수식언, 독립언으로 구분할 수 있다.의미를 중심으로 품사를 구분하면,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로 구분할 수 있다.
체언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단어들을 포함한다. 스스로 명사처럼 쓰일 수 있으며, 주로 조사가 붙는다. 예를 들어 명사(책), 대명사(나), 수사(하나)가 체언이다. 예문: 나는 책을 읽는다. → ‘나’, ‘책’이 체언이다.
관계언
체언과 다른 말의 관계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며, 체언에 붙어 쓰인다. 조사가 대표적이다. 예: 이/가, 을/를, 도, 만, 은/는 등. 예문: 책을 읽는다. → ‘을’이 목적격 조사로 관계언에 해당한다.
용언
문장에서 서술어 역할을 하며, 활용(어미 변화)이 가능하다. 동사와 형용사가 해당한다. 가다, 먹다, 예쁘다, 빠르다 등. 예문: 하늘이 파랗다. → ‘파랗다’는 형용사로 용언이다.
수식언
다른 단어를 꾸며주는 기능을 하며, 체언이나 용언을 수식한다. 관형사(체언 수식), 부사(용언 수식)가 있다. 예: 새, 저(관형사) / 아주, 빨리(부사) 예문: 새 구두를 샀다. → ‘새’가 수식언
독립언
문장 속 다른 말과 문법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말이다. 주로 감탄이나 부름 등을 표현한다. 예: 아!, 어머!, 선생님! 예문: 어머! 정말 예쁘다. → ‘어머!’는 독립언
조사
조사는 체언 뒤에 붙어 문장 내에서 그 체언의 문법적 역할을 나타내는 형식 형태소이다. 크게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로 나눌 수 있다. 격조사는 체언이 문장에서 어떤 자리에 놓이는지를 나타낸다. 예: ‘이/가’(주격), ‘을/ 를’(목적격), ‘의’(관형격), ‘에/에서’(부사격), ‘아’(호격) 등으로 구분한다. 보조사는 체언의 의미에 강조나 대조, 한정 등을 더해주는 기능을 한다. 예: ‘는’, ‘도’, ‘만’, ‘까지’, ‘조차’, ‘마다’, ‘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예문: 나도 갈 거야. / 밥만 먹었다. 접속조사는 두 체언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며, 주로 나열 구조를 만든다. 예: ‘과’, ‘와’, ‘하고’, ‘랑’, ‘이며’ 등이다. 예문: 사과와 바나나를 샀다. 이처럼 조사는 단어 간의 문법적 관계를 표현하며 문장의 구조와 의미 전달을 돕는 필수 요소이다.
품사통용
품사 통용이란 하나의 단어가 문맥에 따라 둘 이상의 품사로 쓰이는 현상을 말한다. 단어의 고정된 품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되는 문장 속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품사 통용은 실제 언어 사용의 유연성을 보여주며, 문장의 구조나 기능에 따라 달라진다. 학교 문법에서는 문맥에 따라 해당 품사를 구분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지도한다. 따라서 단어의 형태뿐 아니라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